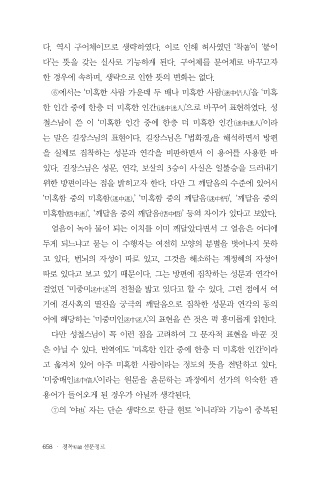Page 658 - 정독 선문정로
P. 658
다. 역시 구어체이므로 생략하였다. 이로 인해 허사였던 ‘착著’이 ‘붙이
다’는 뜻을 갖는 실사로 기능하게 된다. 구어체를 문어체로 바꾸고자
한 경우에 속하며, 생략으로 인한 뜻의 변화는 없다.
⑥에서는 ‘미혹한 사람 가운데 두 배나 미혹한 사람(迷中倍人)’을 ‘미혹
한 인간 중에 한층 더 미혹한 인간(迷中迷人)’으로 바꾸어 표현하였다. 성
철스님이 쓴 이 ‘미혹한 인간 중에 한층 더 미혹한 인간(迷中迷人)’이라
는 말은 길장스님의 표현이다. 길장스님은 『법화경』을 해석하면서 방편
을 실체로 집착하는 성문과 연각을 비판하면서 이 용어를 사용한 바
있다. 길장스님은 성문, 연각, 보살의 3승이 사실은 일불승을 드러내기
위한 방편이라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 다만 그 깨달음의 수준에 있어서
‘미혹함 중의 미혹함(迷中迷),’ ‘미혹함 중의 깨달음(迷中悟)’, ‘깨달음 중의
미혹함(悟中迷)’, ‘깨달음 중의 깨달음(悟中悟)’ 등의 차이가 있다고 보았다.
얼음이 녹아 물이 되는 이치를 이미 깨달았다면서 그 얼음은 어디에
두게 되느냐고 묻는 이 수행자는 여전히 모양의 분별을 벗어나지 못하
고 있다. 번뇌의 자성이 따로 있고, 그것을 해소하는 계정혜의 자성이
따로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방편에 집착하는 성문과 연각이
걸었던 ‘미중미迷中迷’의 전철을 밟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여
기에 견사혹의 멸진을 궁극의 깨달음으로 집착한 성문과 연각의 동의
어에 해당하는 ‘미중미인迷中迷人’의 표현을 쓴 것은 퍽 흥미롭게 읽힌다.
다만 성철스님이 꼭 이런 점을 고려하여 그 문자적 표현을 바꾼 것
은 아닐 수 있다. 번역에도 ‘미혹한 인간 중에 한층 더 미혹한 인간’이라
고 옮겨져 있어 아주 미혹한 사람이라는 정도의 뜻을 전달하고 있다.
‘미중배인迷中倍人’이라는 원문을 윤문하는 과정에서 선가의 익숙한 관
용어가 들어오게 된 경우가 아닐까 생각된다.
⑦의 ‘야也’ 자는 단순 생략으로 한글 현토 ‘이니라’와 기능이 중복된
658 · 정독精讀 선문정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