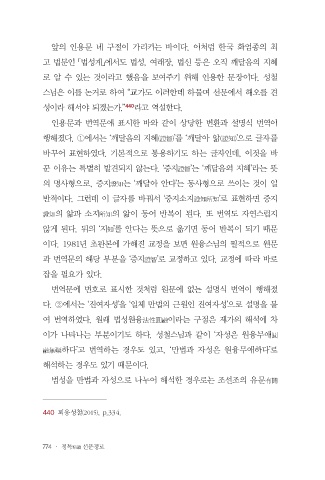Page 774 - 정독 선문정로
P. 774
앞의 인용문 네 구절이 가리키는 바이다. 이처럼 한국 화엄종의 최
고 법문인 「법성게」에서도 법성, 여래장, 법신 등은 오직 깨달음의 지혜
로 알 수 있는 것이라고 했음을 보여주기 위해 인용한 문장이다. 성철
스님은 이를 논거로 하여 “교가도 이러한데 하물며 선문에서 해오를 견
성이라 해서야 되겠는가.” 440 라고 역설한다.
인용문과 번역문에 표시한 바와 같이 상당한 변환과 설명식 번역이
행해졌다. ①에서는 ‘깨달음의 지혜(證智)’를 ‘깨달아 앎(證知)’으로 글자를
바꾸어 표현하였다. 기본적으로 통용하기도 하는 글자인데, 이것을 바
꾼 이유는 특별히 발견되지 않는다. ‘증지證智’는 ‘깨달음의 지혜’라는 뜻
의 명사형으로, 증지證知는 ‘깨달아 안다’는 동사형으로 쓰이는 것이 일
반적이다. 그런데 이 글자를 바꿔서 ‘증지소지證知所知’로 표현하면 증지
證知의 앎과 소지所知의 앎이 동어 반복이 된다. 또 번역도 자연스럽지
않게 된다. 뒤의 ‘지知’를 안다는 뜻으로 옮기면 동어 반복이 되기 때문
이다. 1981년 초판본에 가해진 교정을 보면 원융스님의 필적으로 원문
과 번역문의 해당 부분을 ‘증지證智’로 교정하고 있다. 교정에 따라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
번역문에 번호로 표시한 것처럼 원문에 없는 설명식 번역이 행해졌
다. ②에서는 ‘진여자성’을 ‘일체 만법의 근원인 진여자성’으로 설명을 붙
여 번역하였다. 원래 법성원융法性圓融이라는 구절은 제가의 해석에 차
이가 나타나는 부분이기도 하다. 성철스님과 같이 ‘자성은 원융무애圓
融無礙하다’고 번역하는 경우도 있고, ‘만법과 자성은 원융무애하다’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법성을 만법과 자성으로 나누어 해석한 경우로는 조선조의 유문有聞
440 퇴옹성철(2015), p.334.
774 · 정독精讀 선문정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