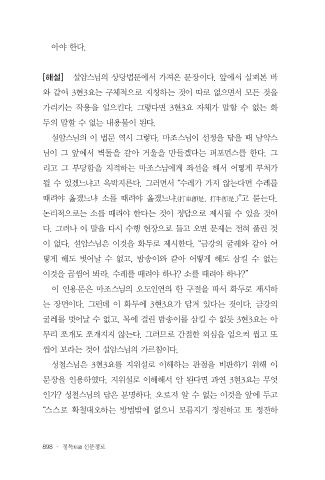Page 898 - 정독 선문정로
P. 898
아야 한다.
[해설] 설암스님의 상당법문에서 가져온 문장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
와 같이 3현3요는 구체적으로 지칭하는 것이 따로 없으면서 모든 것을
가리키는 작용을 일으킨다. 그렇다면 3현3요 자체가 말할 수 없는 화
두의 말할 수 없는 내용물이 된다.
설암스님의 이 법문 역시 그렇다. 마조스님이 선정을 닦을 때 남악스
님이 그 앞에서 벽돌을 갈아 거울을 만들겠다는 퍼포먼스를 한다. 그
리고 그 부당함을 지적하는 마조스님에게 좌선을 해서 어떻게 부처가
될 수 있겠느냐고 윽박지른다. 그러면서 “수레가 가지 않는다면 수레를
때려야 옳겠느냐 소를 때려야 옳겠느냐. (打車卽是, 打牛卽是.)”고 묻는다.
논리적으로는 소를 때려야 한다는 것이 정답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
다. 그러나 이 말을 다시 수행 현장으로 들고 오면 문제는 전혀 풀린 것
이 없다. 설암스님은 이것을 화두로 제시한다. “금강의 굴레와 같아 어
떻게 해도 벗어날 수 없고, 밤송이와 같아 어떻게 해도 삼킬 수 없는
이것을 곱씹어 봐라. 수레를 때려야 하나? 소를 때려야 하나?”
이 인용문은 마조스님의 오도인연의 한 구절을 따서 화두로 제시하
는 장면이다. 그런데 이 화두에 3현3요가 담겨 있다는 것이다. 금강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고, 목에 걸린 밤송이를 삼킬 수 없듯 3현3요는 아
무리 쪼개도 쪼개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간절한 의심을 일으켜 씹고 또
씹어 보라는 것이 설암스님의 가르침이다.
성철스님은 3현3요를 지위설로 이해하는 관점을 비판하기 위해 이
문장을 인용하였다. 지위설로 이해해서 안 된다면 과연 3현3요는 무엇
인가? 성철스님의 답은 분명하다. 오로지 알 수 없는 이것을 앞에 두고
“스스로 확철대오하는 방법밖에 없으니 모름지기 정진하고 또 정진하
898 · 정독精讀 선문정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