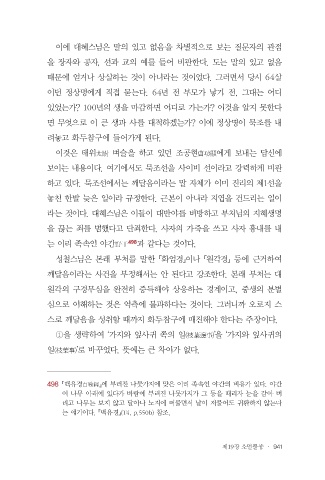Page 941 - 정독 선문정로
P. 941
이에 대혜스님은 말의 있고 없음을 차별적으로 보는 질문자의 관점
을 장자와 공자, 선과 교의 예를 들어 비판한다. 도는 말의 있고 없음
때문에 얻거나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당시 64살
이던 정상명에게 직접 묻는다. 64년 전 부모가 낳기 전, 그대는 어디
있었는가? 100년의 생을 마감하면 어디로 가는가? 이것을 알지 못한다
면 무엇으로 이 큰 생과 사를 대적하겠는가? 이에 정상명이 묵조를 내
려놓고 화두참구에 들어가게 된다.
이것은 태위太尉 벼슬을 하고 있던 조공현曹功顯에게 보내는 답신에
보이는 내용이다. 여기에서도 묵조선을 사이비 선이라고 강력하게 비판
하고 있다. 묵조선에서는 깨달음이라는 말 자체가 이미 진리의 제1선을
놓친 한발 늦은 일이라 규정한다. 근본이 아니라 지엽을 건드리는 일이
라는 것이다. 대혜스님은 이들이 대반야를 비방하고 부처님의 지혜생명
을 끊는 죄를 범했다고 단죄한다. 사자의 가죽을 쓰고 사자 흉내를 내
는 이리 족속인 야간野干 498 과 같다는 것이다.
성철스님은 본래 부처를 말한 『화엄경』이나 『원각경』 등에 근거하여
깨달음이라는 사건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본래 부처는 대
원각의 구경무심을 완전히 증득해야 상응하는 경계이고, 중생의 분별
심으로 이해하는 것은 억측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로지 스
스로 깨달음을 성취할 때까지 화두참구에 매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①을 생략하여 ‘가지와 잎사귀 쪽의 일(枝葉邊事)’을 ‘가지와 잎사귀의
일(枝葉事)’로 바꾸었다. 뜻에는 큰 차이가 없다.
『
498 백유경百喻經』에 부러진 나뭇가지에 맞은 이리 족속인 야간의 비유가 있다. 야간
이 나무 아래에 있다가 바람에 부러진 나뭇가지가 그 등을 때리자 눈을 감아 버
리고 나무는 보지 않고 달아나 노지에 머물면서 날이 저물어도 귀환하지 않는다
는 얘기이다. 『백유경』(T4, p.550b) 참조.
제19장 소멸불종 · 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