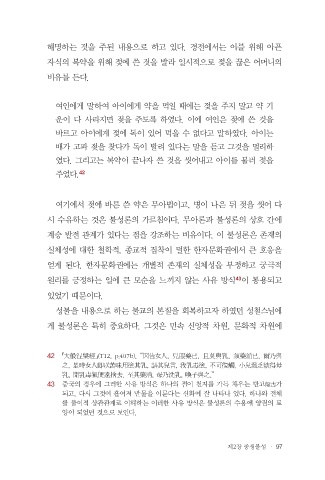Page 97 - 정독 선문정로
P. 97
해명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경전에서는 이를 위해 아픈
자식의 복약을 위해 젖에 쓴 것을 발라 일시적으로 젖을 끊은 어머니의
비유를 든다.
여인에게 말하여 아이에게 약을 먹일 때에는 젖을 주지 말고 약 기
운이 다 사라지면 젖을 주도록 하였다. 이에 여인은 젖에 쓴 것을
바르고 아이에게 젖에 독이 있어 먹을 수 없다고 말하였다. 아이는
배가 고파 젖을 찾다가 독이 발려 있다는 말을 듣고 그것을 멀리하
였다. 그리고는 복약이 끝나자 쓴 것을 씻어내고 아이를 불러 젖을
주었다. 42
여기에서 젖에 바른 쓴 약은 무아법이고, 병이 나은 뒤 젖을 씻어 다
시 수유하는 것은 불성론의 가르침이다. 무아론과 불성론의 상호 간에
계승 발전 관계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비유이다. 이 불성론은 존재의
실체성에 대한 철학적, 종교적 집착이 덜한 한자문화권에서 큰 호응을
얻게 된다. 한자문화권에는 개별적 존재의 실체성을 부정하고 궁극적
원리를 긍정하는 일에 큰 모순을 느끼지 않는 사유 방식 이 통용되고
43
있었기 때문이다.
성불을 내용으로 하는 불교의 본질을 회복하고자 하였던 성철스님에
게 불성론은 특히 중요하다. 그것은 민속 신앙적 차원, 문화적 차원에
『
42 大般涅槃經』(T12, p.407b), “因告女人, 兒服藥已, 且莫與乳, 須藥消已, 爾乃與
之. 是時女人卽以苦味用塗其乳, 語其兒言, 我乳毒塗, 不可復觸. 小兒渴乏欲得母
乳, 聞乳毒氣便遠捨去. 至其藥消, 母乃洗乳, 喚子與之.”
43 중국의 경우에 그러한 사유 방식은 하나의 점이 천지를 가득 채우는 반고盤古가
되고, 다시 그것이 흩어져 만물을 이룬다는 신화에 잘 나타나 있다. 하나와 전체
를 불이적 상관관계로 이해하는 이러한 사유 방식은 불성론의 수용에 양질의 토
양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제2장 중생불성 · 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