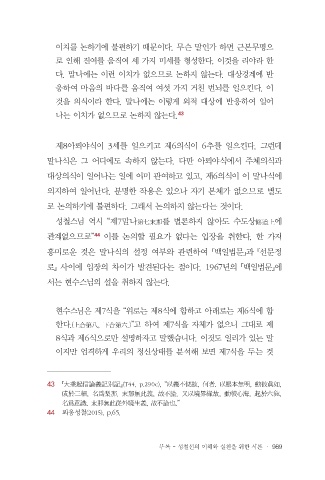Page 989 - 정독 선문정로
P. 989
이치를 논하기에 불편하기 때문이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근본무명으
로 인해 진여를 움직여 세 가지 미세를 형성한다. 이것을 리야라 한
다. 말나에는 이런 이치가 없으므로 논하지 않는다. 대상경계에 반
응하여 마음의 바다를 움직여 여섯 가지 거친 번뇌를 일으킨다. 이
것을 의식이라 한다. 말나에는 이렇게 외적 대상에 반응하여 일어
나는 이치가 없으므로 논하지 않는다. 43
제8아뢰야식이 3세를 일으키고 제6의식이 6추를 일으킨다. 그런데
말나식은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 다만 아뢰야식에서 주체의식과
대상의식이 일어나는 일에 이미 관여하고 있고, 제6의식이 이 말나식에
의지하여 일어난다. 분명한 작용은 있으나 자기 본체가 없으므로 별도
로 논의하기에 불편하다. 그래서 논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성철스님 역시 “제7말나第七末那를 별론하지 않아도 수도상修道上에
관계없으므로” 이를 논의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취한다. 한 가지
44
흥미로운 것은 말나식의 설정 여부와 관련하여 『백일법문』과 『선문정
로』 사이에 입장의 차이가 발견된다는 점이다. 1967년의 『백일법문』에
서는 현수스님의 설을 취하지 않는다.
현수스님은 제7식을 “위로는 제8식에 합하고 아래로는 제6식에 합
한다. (上合第八, 下合第六.)”고 하여 제7식을 자체가 없으니 그대로 제
8식과 제6식으로만 설명하자고 말했습니다. 이것도 일리가 있는 말
이지만 엄격하게 우리의 정신상태를 분석해 보면 제7식을 두는 것
『
43 大乘起信論義記別記』(T44, p.290c), “以義不便故, 何者. 以根本無明, 動彼眞如,
成於三細, 名爲梨那. 末那無此義, 故不論. 又以境界緣故, 動彼心海, 起於六麁,
名爲意識. 末那無此從外境生義, 故不論也.”
44 퇴옹성철(2015), p.65.
부록 - 성철선의 이해와 실천을 위한 시론 · 989